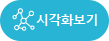| 항목 ID | GC04901730 |
|---|---|
| 한자 | 道峯書院-絶句- |
| 이칭/별칭 | 「숙도봉서원삼절(宿道峯書院三絶)」 |
| 분야 | 구비 전승·언어·문학/문학 |
| 유형 | 작품/문학 작품 |
| 지역 |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|
| 시대 | 조선/조선 후기 |
| 집필자 | 안정심 |
| 저자 생년 시기/일시 | 1556년 - 「도봉서원에 묵으면서 세 절구를 읊다」 저자 이항복 출생 |
|---|---|
| 저술|창작|발표 시기/일시 | 1614년 |
| 저자 몰년 시기/일시 | 1618년 - 「도봉서원에 묵으면서 세 절구를 읊다」 저자 이항복 사망 |
| 배경 지역 | 도봉서원 -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|
| 성격 | 한시|칠언 절구 |
| 작가 | 이항복(李恒福)[1556~1618] |
[정의]
1614년 가을 무렵 백사 이항복이 도봉서원에 묵으며 지은 칠언 절구의 한시.
[개설]
도봉서원(道峯書院)은 1573년(선조 6년)에 조광조(趙光祖)를 기리기 위해서 조광조가 자주 찾았던 도봉산 자락의 영국사(寧國寺) 터에 설립한 서원으로, 설립과 동시에 사액(賜額)되었다. 뒤에 우암(尤庵) 송시열(宋時烈)이 도봉 서원에 머물며 강학을 한 인연으로 송시열도 추가로 배향되었다.
백사(白沙) 이항복(李恒福)[1556~1618]은 1614년(광해군 6) 1월에 좌의정에서 체직되어 노원(蘆原)으로 물러나 머물고 있었다. 그 전해인 1613년(광해군 5)에는 인목 대비(仁穆大妃)의 아버지인 김제남(金悌男)이 영창 대군(永昌大君)을 옹립하려 하였다는 무고로 사사되고 그 여파로 폐모론이 일기 시작하였는데, 함께 폐모론을 반대하였던 한음(漢陰) 이덕형(李德馨)도 세상을 떠나고 만다. 「도봉서원에 묵으면서 세 절구를 읊다」는 1614년 노원에 머물고 있을 당시 지어진 시로, 가을날 도봉서원에서 유숙하며 지기를 잃은 슬픔과 시국에 대한 걱정을 담고 있다
[구성]
「도봉서원에 묵으면서 세 절구를 읊다」는 모두 3수의 칠언 절구로 이루어져 있다. 제1수는 1~2구에서 도봉산의 풍광을 읊고, 3~4구에서는 지기를 잃은 슬픔이 담겨 있다. 제2수와 제3수에서는 시국에 대한 불안감[제2수 3구, 제3수 2구]과 근근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심정[제2수 4구, 제3수 3~4구]을 표현하고 있다.
[내용]
도봉상색은한림(道峯霜色隱寒林)[도봉산 단풍 빛은 찬 숲에 은은한데]
심간향공생박음(深磵響空生薄陰)[깊은 계곡 메아리는 얇은 그늘에서 나누나]
석로태황인거원(石老苔荒人去遠)[돌은 늙고 이끼 거칠며 사람 멀리 떠났으니]
아양수화절현금(峩洋誰和絶絃琴)[줄 끊긴 거문고로 아양곡을 누가 화답하리오]
조정미긍용허명(朝廷未肯用虛名)[조정에선 헛된 명성을 쓰려고 하지 않는데]
야외무전가우경(野外無田可耦耕)[야외엔 나란히 밭 갈 만한 토지도 없어라]
진퇴즉금난착각(進退卽今難着脚)[나가나 물러가나 발붙이기가 어려우니]
걸위류원로서생(乞爲留院老書生)[서원에 머무는 늙은 서생이나 되길 바라네]
산중일야소성화(山中一夜笑聲和)[산중에선 하룻밤 웃음소리가 화락한데]
산외분분수어다(山外紛紛誶語多)[산 밖엔 분분하게 꾸짖는 말이 많도다]
금일오제행무사(今日吾儕幸無事)[오늘날 우리 무리는 다행히 아무 일도 없어]
침류당리일장가(枕流堂裏一長歌)[침류당 안에서 한 번 길이 노래를 하누나]
성휘동숙 야반 사자가지(聖徽同宿 夜半 使子歌之)[성휘(聖徽)와 함께 자는데, 밤중에 그의 아들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]
[특징]
운자는 제1수는 ‘침(侵)’ 운의 ‘임(林)’[1구], ‘음(陰)’[2구], ‘금(琴)’[4구]이고, 제2수는 ‘경(庚)’ 운의 ‘명(名)’[1구], ‘경(耕)’[2구], ‘생(生)’[4구]이며, 제3수는 ‘가(歌)] 운의 ’화(和)[1구], ‘다(多)’[2구], ‘가(歌)’[4구]이다.
[의의와 평가]
「도봉서원에 묵으면서 세 절구를 읊다」는 인목 대비의 아버지인 김제남의 사사 이후 폐모론이 이는 와중에 좌의정에서 체직되어 노원에 우거하고 있는 작가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. 첫 번째 절구에서는 ‘백아절현(伯牙絶絃)’ 고사를 인용하여 1년 전 이맘 때 세상을 떠난 평생의 지기 한음 이덕형을 그리워하고 있다. 같이 폐모론을 반대하려는 상소를 준비하였으나 본인은 체직이 되고, 얼마 후 이덕형마저 세상을 떠나 버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노원에 우거하며 하루하루를 불안 속에서 지내는 심정을 두 번째와 세 번째 절구에서 표현하고 있다.
- 『백사집(白沙集)』
- 이항복, 임정기 역, 『국역 백사집(白沙集)』1(한국 고전 번역원)
- 신승운, 『백사집(白沙集)』 해제(『한국 문집 총간 해제』)
- 한국 고전 종합 DB(http://db.itkc.or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