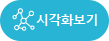| 항목 ID | GC04901194 |
|---|---|
| 한자 | 道峯帖 |
| 분야 | 역사/전통 시대,문화유산/유형 유산 |
| 유형 | 유물/서화류 |
| 지역 | 서울특별시 도봉구 |
| 시대 | 조선/조선 후기 |
| 집필자 | 박은순 |
| 작가 생년 시기/일시 | 1758년 - 『도봉첩』 작가 김석신 출생 |
|---|---|
| 성격 | 산수화 |
| 작가 | 김석신 |
| 재질 | 지본담채 |
[정의]
조선 후기 선비 이재학과 서용보가 도봉산을 유람하며 시회를 가지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제작한 화첩.
[개설]
『도봉첩(道峯帖)』은 선비인 이재학(李在學)[1745~1806], 서용보(徐龍輔)[1757~1824] 등이 도봉산(道峰山)을 유람하며 시회를 가지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제작한 화첩이다. 이재학은 관료로서 활약하다가 순조 즉위 후 곧 귀양을 가는 등 고초를 겪다가 1806년에 사망하였다. 서용보는 노론 출신의 고위 관료로서 영의정과 좌의정을 역임한 세력가였다.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면 『도봉첩』은 1800년 이전, 18세기 말 경의 작품일 가능성이 엿보인다. 현재 책은 없어지고 제첩(題帖)에 붙어있던 윗그림인 「도봉도(道峯圖)」만이 전하고 있다. 「도봉도」는 이재학, 서용보의 도봉산 유람에 함께했던 화원 김석신(金碩臣)[1758~?]이 그렸다.
김석신의 본관은 개성(開城). 자는 군익(君翼), 호는 초원(蕉園)이다. 조선 후기 가장 대표적인 화원 집안의 하나인 개성 김씨 집안 출신으로 복헌(復軒) 김응환(金應煥)[1742~1789]의 양자가 되어 화업을 익혔다. 형 역시 유명한 화원인 김득신(金得臣)이다. 김석신은 부사과(副司果)를 지냈고, 산수화와 인물화를 잘 그렸으며, 「도봉도」 이외에도 진경 산수화가 여러 점 전해지고 있다.
[형태]
「도봉도」의 크기는 36㎝×53.7㎝이고, 종이에 담채를 사용하였다. 그림 옆에 붙은 별지에는 화첩의 표제인 ‘도봉첩’이란 글씨가 적혀 있다. 그림 옆의 별지에 적힌 표제 아래에는 “초원 김석신이 경치를 그린 것으로 명류 이재학과 서용보가 도봉산을 산책하고 그리게 한 것이다[蕉園金碩臣之寫景此爲名流李在學徐龍輔等散策於道峰之作也]”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화첩의 제작 동기와 주문자 등을 알 수 있다.
[내용]
「도봉도」는 웅장한 도봉산과 그 옆에 솟은 북한산(北漢山) 인수봉(仁壽峰)의 험준한 암봉을 배경으로 도봉산 골짜기에 위치한 도봉 서원(道峯書院)을 그렸으며, 서원 앞으로는 시원한 계곡물이 흘러내리고 있다.
[특징]
「도봉도」의 전체적인 구도는 정선(鄭敾)의 진경 산수화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 준다. T자형의 소나무와 미법으로 표현한 수지법, 빠른 필치와 짙은 먹, 암봉에 구사된 적묵 기법 등이 정선 화풍에 연원을 둔 것이다. 또한 전체적으로 청색과 녹색의 선염을 풍부하게 사용한 점, 원경에 보이는 굵은 필선의 펜촉 모양의 암봉들에는 김석신의 양아버지인 김응환의 영향이 엿보인다. 그러나 김석신은 두 대가들의 화풍을 조합하고, 여기에 자신만의 독특한 필치와 색감을 더하여 고유의 개성적인 화풍을 창출하였다. 정선에 비해 좀 더 예리하고 산만한 독특한 필치와 맑은 색채 등에서 김석신의 개성이 나타나며, 도봉산과 북한산의 강렬한 산세를 잘 전달하고 있다.
[의의와 평가]
「도봉도」는 화원 김석신이 전통적인 대가들의 화풍을 절충하여 구사한 것을 잘 보여 주고 있으며, 그의 다른 작품에 비하여 정선의 영향이 많이 반영된 화풍을 구사하였다. 이를 통해 18세기 후반 이후에도 보수적인 미감을 가진 문인들이 정선풍의 진경 산수화를 애호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.
- 안휘준, 『한국 회화사』(일지사, 1980)
- 안휘준 감수, 『한국의 미-산수화(하)』12(중앙 일보사, 1982)
- 박수희, 「조선 후기 개성 김씨 화원 연구」(서울 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, 200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