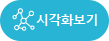| 항목 ID | GC04900608 |
|---|---|
| 한자 | 南宮悌 |
| 이칭/별칭 | 우중(友仲),연안공(延安公) |
| 분야 | 역사/전통 시대,성씨·인물/전통 시대 인물 |
| 유형 | 인물/문무 관인 |
| 지역 |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산86 |
| 시대 | 조선/조선 후기 |
| 집필자 | 황향주 |
| 출생 시기/일시 | 1543년 |
|---|---|
| 활동 시기/일시 | 1568년 - 남궁제 무진 증광시 증광 진사 급제 |
| 특기 사항 시기/일시 | 1596년 - 남궁제 가자(加資)를 둘러싸고 조정에서 논쟁 발생 |
| 부임|활동지 | 남궁제 부임지 - 황해도 연백군 |
| 부임|활동지 | 남궁제 부임지 - 황해도 연백군 |
| 묘소|단소 | 남궁제 묘소 -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산86 |
| 성격 | 문신 |
| 성별 | 남 |
| 본관 | 함열(咸悅) |
| 대표 관직 | 연안 부사 |
[정의]
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에 묘가 있는 조선 후기의 문신.
[가계]
본관은 함열(咸悅). 자는 우중(友仲). 할아버지는 이조 판서를 역임한 남궁찬(南宮璨)이고, 할머니는 신자승(申自繩)의 딸인 평산 신씨(平山申氏)이다. 아버지는 함경도 관찰사 남궁숙(南宮淑)이며, 어머니는 고흥 유씨(高興柳氏)이다. 부인은 풍천 임씨(豊川任氏)로, 사이에 4남을 두었다. 남궁제(南宮悌)[1543~?]는 함열 남궁씨 7파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연안공파(延安公派)의 파조로 추숭되었다.
[활동 사항]
남궁제는 1568년(선조 1) 거행된 증광시에서 증광 진사 3등 33위와 증광 생원 3등 10위로 생원·진사 양시(兩試)에 합격하였다. 『선조실록(宣祖實錄)』과 『사류재집(四留齋集)』에 따르면, 과거 합격 후 백천 군수와 연안 부사를 역임한 것으로 확인된다. 임진왜란이 일어난 다음 해인 1593년(선조 26) 유성룡(柳成龍)이 감진관(監賑官)에 임명하여 호남에서 조운된 곡식을 이용해 한양의 기근 문제를 해결하였다. 남궁제는 지방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백성을 잘 다스리고 국사(國事)를 성실히 처리한 점을 인정받아 1596년(선조 29) 당상(堂上)을 가자(加資) 받았다. 이 과정에서 둔전(屯田)을 이용하여 사욕을 채우고 역(役)을 공평히 하지 못한 과거 행적들이 문제가 되면서 그의 가자를 둘러싸고 조정 내에서 공방이 벌어지기도 하였다.
[묘소]
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함열 남궁씨 제1 묘역 내에 아버지 남궁숙의 묘와 함께 조성되어 있다.
- 『선조실록(宣祖實錄)』
- 『서애집(西厓集)』
- 『사류재집(四留齋集)』
- 『함열 남궁씨 족보』 (함열 남궁씨 족보 편찬 위원회, 1994)
- 『서울특별시 문화 유적 지표 조사 종합 보고서』 Ⅱ(서울 역사박물관, 2005)
- 한국 역대 인물 종합 정보 시스템(http://people.aks.ac.kr)